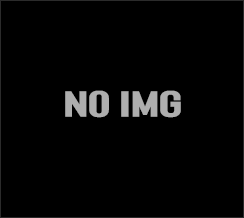[리뷰] 시즌1 때의 핍진성과 캐릭터의 완성도 이어지지 않아
[김건의 기자]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입니다.
전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다. <오징어게임> 시즌3는 여러 방면으로 기대를 받았다. 사실상 다음 이야기를 위한 발판처럼 여겨졌던 시즌2의 아쉬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암울한 전개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시즌이었다.
시즌3는 황동혁 감독의 염세적 비전을 극한으로 밀어붙인 작품이다. <오징어 게임>의 시작을 돌이켜보자. 시즌1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은유하며 이를 비난하는 부조리극이었다면, 시즌3는 견고한 시스템에 맞서려는 영웅서사는 작동하지 않으며 끝내 시스템을 뒤바꿀 수 없다는 무력함을 안겨주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른다.
 |
| ▲ <오징어게임> 시즌3 스틸 |
| ⓒ 넷플릭스 |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무력감, 기능적인 캐릭터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은 시즌1에서 순전히 운과 낙천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믿고 도우는 선의가 있었기에 게임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시즌2에서는 오징어게임 자체를 사람들끼리의 살육을 멈추려는 인물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시즌3는 스스로 이 게임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캐릭터의 일관성과 데스게임 장르의 핍진성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성기훈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캐릭터의 타락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부추기는 폭력이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창작자의 의도를 위한 기능적인 요소처럼 다뤄진다. 그래도 캐릭터 특유의 매력과 서사가 존재했던 시즌1과는 달리, 시즌2부터 존재하는 캐릭터들은 기호와 설정으로만 움직이는 체스판 위의 말처럼 느껴진다. 관객들이 주로 비판하는 성기훈이라는 캐릭터의 일관성은 창작자의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발화하기 위해 일관성이라는 궤도에서 줄곧 이탈된다.
시즌1에서 기훈의 동네 후배였던 상우가 밈으로 아직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게임 밖에서의 삶과 전사(前史)가 뚜렷했기 때문이고, 우승을 위해 행동하는 일관성까지 지녔기 때문이다. 반면 시즌3의 새로운 참가자들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기능적 존재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들의 죽음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순서에 맞춰 사라지는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
| ▲ <오징어게임> 시즌3 스틸 |
| ⓒ 넷플릭스 |
감독의 비관적인 대한민국 진단서
다시 한 번 시즌1의 캐릭터들을 톺아본다.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문제시되는 사회현상을 고스란히 옮겨온 캐릭터 구성을 갖췄었다. 시즌2에서는 캐릭터가 더욱 다채로워졌다. 젊은 미혼모, 코인/주식 투자에 빠진 이대남, 마약에 노출된 연예인, 언변으로 군중을 홀리는 정치인, 인간 개인의 취약한 감정을 파고드는 무속인까지. 해당 시리즈는 황동혁 감독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시되는 인간 군상이 한데 모인 세계다.
인간의 작은 선의를 희망처럼 다뤘던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을 통해 그는 대한민국에 일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씁쓸하게 말하는 것만 같다. 게임을 멈추고자 한 기훈은 무력감에 빠지지만 준희(조유리)에게 자신의 아이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끝까지 게임에 참전한다. 하지만 기훈을 포함한 모든 성인 참가자들이 경쟁 끝에 사라지고 게임 도중에 태어난 아기만 살아남는 것은 현재 거대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문제시되는 시스템(오징어게임)을 바꾸기란 사실상 어렵고, 다음 세대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마치 시즌1에서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라고 외치며 인간다움을 포기해선 안된다던 성기훈의 절규는 결국 공허한 외침이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닐까. 오징어게임은 여전히 다시 반복될 것이고, 이 경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서로를 죽고 죽일 테니 말이다.
 |
| ▲ <오징어게임> 시즌3 스틸컷 |
| ⓒ 넷플릭스 |
이 또한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사실상 마지막 시즌이라고 말한 감독의 인터뷰와는 달리, 시리즈의 결말을 보면 마치 '오징어게임'이라는 프렌차이즈를 글로벌 확장을 위한 거대한 발사대처럼 활용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향한 환멸에 가까운 그의 비전이 무색하게도 시리즈의 마지막 시퀀스는 오징어게임을 글로벌 프렌차이즈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넷플릭스의 야심까지 느껴진다. 극중 LA에서 딱지맨으로 케이트 블란쳇이 카메오 출연한 점이 그렇다. 스토리의 필연성보다는 글로벌 인지도와 상업적 계산이 우선된 캐스팅이다.
작품 내에서 게임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설정과 작품 외적으로 할리우드 스타를 영입하는 전략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선택은 작품이 비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황동혁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시즌1 때 못 번 돈을 벌기 위해 시즌2를 만들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시즌3의 마지막 시퀀스 또한 넷플릭스의 상업적 확장성이 고려된 장면처럼 보이는 건 과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완결성을 놓치지는 않은 작품임은 사실이다. <오징어 게임>은 시즌1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시즌2의 혼란을 거쳐 시즌3에서 염세적인 비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즌1이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과 관계 묘사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희미해졌다. 결과적으로 시리즈 전체가 특정한 의도를 위한 도구적 기능만 기억될 뿐이다. 창작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기능, 넷플릭스의 시리즈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기능, 미래 스핀오프를 위한 기능. 이 모든 기능들이 온전한 작품의 캐릭터와 서사, 문제의식 모두를 깎아버린 셈이 되었다.
'명확한 절망'이라는 결말은 오히려 오히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처럼 느껴진다. 물론 <오징어 게임>은 가장 흥행했던 'K-드라마'라는 기호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이야기에 내포된 문제의식들 또한 쉽게 휘발될 것이다. 애석한 결말이다.
 |
| ▲ <오징어게임> 시즌3 스틸 |
| ⓒ 넷플릭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